 공간을 위한 변주곡-기옥란 작가
공간을 위한 변주곡-기옥란 작가
[포스트21=이우진 기자] 꽃이 진 가지에 봄비와 함께 연두빛 어린 새싹들이 하루가 다르게 돋아나고 수많은 꽃들이 소리없이 피었다가 진다.
몽골 들판에 피어난 수많은 야생화들, 님프들과 들판에서 꽃을 따는 페르세포네, 장한나가 연주하는 첼로곡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76-2, 키 작은 보랏빛 제비꽃과 민들레, 연분홍과 연보라빛 라일락꽃 향기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요즈음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것들이 정지되고 침묵하고 있으며 언제부턴지 자연스럽게 집 근처 공원 산책도 줄어들었다.
 공간을 위한 변주곡2-기옥란 작가
공간을 위한 변주곡2-기옥란 작가
코로나로 사람들은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처럼, 꽃과 꽃받침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것일까? 꽃이 질 때는 꽃뿐만 아니라 꽃잎 진 자리가 퉁퉁 부어 이파리마다 힘줄이 파랗다고 한다. 꽃이 지고 잎이 돋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고 자연의 질서이며 순환인 줄 알지만 어떤 이별이든 이별은 고통이고 슬픔이다.
대나무의 마디 마디와 같은 규칙적인 잠시의 휴식이나 쉼이 아닌, 숨가쁘게 돌아가던 전 세계의 도시 기능이 멈춰있는 요즘 나는 현대도시의 대중 소비문화에 대해서 말한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는 광고와 존 버거(John Berger)의 광고 문안인 “당신들이 소유한 것이 곧 당신.”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기옥란 작가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기옥란 작가
이 글에서 선명하게 표현된 것처럼 소비가 미덕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우리의 통찰은 사라지고 경계인처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모호함 속에서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꽃잎들이 떠난 빈 꽃가지에 앉는 일
그립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비워두는 일
<꽃 진 자리에> 문태준
현대 도시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네온사인 불빛 너머의 욕망과 결핍, 소유와 질투의 시선으로 변화와 기회, 새로움에 목마른 젊은이들은 도시가 주는 매력에 이끌려 그곳에서 자신만의 개별성과 익명성과 칸막이를 만들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상품 및 기호와 이미지의 소비자가 되어간다.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2-기옥란 작가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2-기옥란 작가
우리는 끊임없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기호와 이미지를 접하고 그것을 소비하면서 자신이 상품 자본사회의 일원인 것에 안도하면서 새로운 기호와 이미지를 기다리는 시뮬라시옹의 소비자가 되고 있다. 도시는 젊음의 공간이고 자유의 상징이며 변화의 진원지이고 최초의 소비자를 키우는 곳이다. 코로나는 인간의 지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시선의 확장성과 많은 깨달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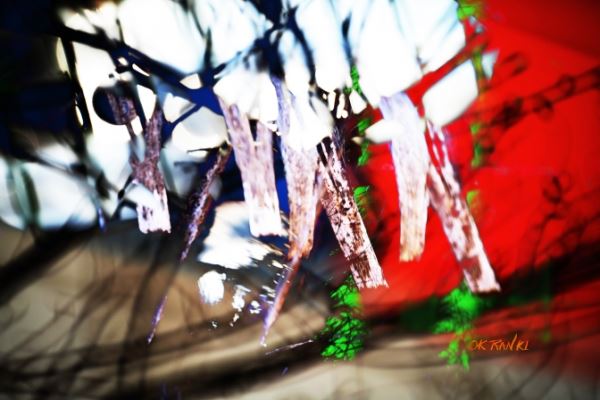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3-기옥란 작가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3-기옥란 작가
우리는 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하늘이 맑아지면서 오염된 공기 등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다. 이제는 도시로의 나아감과 자연으로의 물러남이 있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여백이 있어야 하며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21C는 우열과 경쟁의 무한 경쟁적 직선의 추구가 아니라 부드러움의 여성성과 음적인 사유, 곡선의 미학이 어우러지고 감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4-기옥란 작가
트랜스휴먼 원형으로부터의 사유4-기옥란 작가
큰 나무는 태풍이 올수록 뿌리를 깊이 내린다. 정지된 시간과 공간, 소용돌이와 고요한 눈은 함수관계이다. 소용돌이 없이 눈이 안 생기고 눈이 없이 소용돌이가 안 생긴다.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